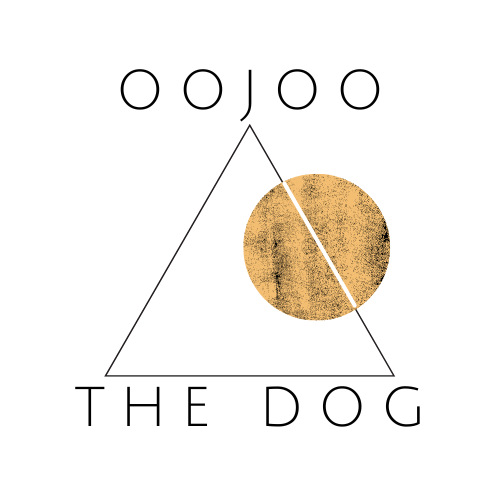-
목차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인지과학 – 뇌의 연결성은 사회적 인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Autism Spectrum Disorder, ASD)는 사회적 상호작용, 의사소통, 반복적인 행동 패턴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신경발달 장애이다. 전 세계적으로 약 1~2%의 인구가 ASD를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정도의 증상과 개별적인 특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스펙트럼’이라는 개념이 사용된다.
인지과학과 신경과학에서는 ASD가 단순한 행동적 문제가 아니라, 뇌의 연결성(connectivity) 이상과 관련된 신경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밝혀왔다. ASD 환자는 뇌의 특정 영역 간 연결성이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르게 형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차이가 사회적 인지(social cognition), 감각 처리(sensory processing), 실행 기능(executive function)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단일한 원인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신경 발달 장애로, 과연 뇌의 연결성이 ASD의 특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ASD와 관련된 주요 뇌 영역과 연결성의 차이
ASD는 특정한 뇌 영역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뇌 네트워크의 연결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특히 전전두엽(prefrontal cortex), 측두엽(temporal lobe), 후두엽(occipital lobe), 변연계(limbic system), 그리고 소뇌(cerebellum)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전전두엽은 실행 기능과 사회적 판단을 담당하는 영역으로, ASD 환자들은 전전두엽과 다른 뇌 영역 간의 연결성이 약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사회적 규칙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측두엽은 언어 처리와 감정 해석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측두두정 접합부(temporoparietal junction, TPJ)와 편도체(amygdala)의 연결성이 약할 경우, 타인의 감정을 해석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 ASD 환자들은 종종 타인의 표정을 해석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이는 이러한 신경학적 차이와 관련될 수 있다.
후두엽은 시각 정보 처리를 담당하며, ASD 환자는 후두엽과 다른 뇌 영역 간의 연결 패턴이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얼굴 인식을 담당하는 방추상회(fusiform gyrus)의 활동이 저하될 경우, ASD 환자들은 얼굴을 인식하고 기억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
변연계는 감정 조절과 사회적 동기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며, ASD 환자는 변연계와 전전두엽 간의 연결이 약화되어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소뇌는 운동 조절뿐만 아니라 인지 기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ASD 환자들은 소뇌의 기능 이상으로 인해 감각 과민(sensory hypersensitivity)이나 특정 행동 패턴을 보일 수 있다.
이처럼 ASD는 개별적인 뇌 영역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신경 네트워크의 연결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며, 이는 다양한 증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ASD와 신경 연결성 – 과연 과연결인가, 저연결인가?
ASD에서 뇌의 연결성 차이를 설명하는 두 가지 주요 가설이 존재한다.
- 과연결성 가설(Hyperconnectivity Hypothesis)
일부 연구에서는 ASD 환자들이 특정한 뇌 영역 내에서 과도한 연결성을 보이며, 이는 감각 정보 처리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감각 정보를 처리하는 1차 감각 피질(primary sensory cortex)과 관련된 연결성이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 ASD 환자들은 특정한 소리나 빛에 과민 반응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 저연결성 가설(Hypoconnectivity Hypothesis)
반면, ASD 환자들은 장거리 뇌 네트워크(long-range connectivity) 간의 연결이 약화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전전두엽과 측두엽 간의 연결성이 감소할 경우, 복잡한 사회적 정보를 통합하는 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
최근 연구에서는 ASD 환자들이 단거리 연결(short-range connectivity)은 증가하고, 장거리 연결(long-range connectivity)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혼합적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ASD의 증상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으며, 특정한 개인에게서는 과연결성이, 다른 개인에게서는 저연결성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ASD와 신경전달물질 – 글루타메이트와 가바의 균형 변화
ASD의 신경전달물질 시스템에서도 독특한 차이가 발견되며, 특히 글루타메이트(glutamate)와 감마아미노부티르산(GABA)의 균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글루타메이트는 흥분성 신경전달물질(excitory neurotransmitter)로, 신경 세포 간의 신호 전달을 촉진한다. ASD 환자들은 특정한 뇌 영역에서 글루타메이트의 과활성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감각 과민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반대로, 가바(GABA)는 억제성 신경전달물질(inhibitory neurotransmitter)로, 신경 활동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ASD 환자는 가바 시스템의 기능이 저하될 경우가 많으며, 이는 신경 네트워크 내의 균형을 깨뜨려 감각 처리 문제와 사회적 인지 결함을 초래할 수 있다.
이처럼 글루타메이트와 가바의 불균형은 ASD에서 신경 연결성이 비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새로운 치료법 개발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ASD 치료의 최신 연구와 미래 전망
ASD 치료는 현재 주로 행동 치료와 인지 치료를 기반으로 이루어지지만, 최근 신경과학적 접근이 결합된 새로운 치료법이 연구되고 있다.
뇌 자극 치료(Brain Stimulation Therapy): 비침습적 뇌 자극 기술(예: 경두개 자기 자극법, TMS)을 이용하여 특정한 뇌 영역을 조절함으로써 ASD 증상을 완화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다.
신경전달물질 조절 약물: 글루타메이트와 가바 시스템을 조절하는 약물이 ASD 치료에 효과적일 가능성이 연구되고 있으며, 일부 임상 시험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AI 기반 조기 진단: 인공지능과 뇌 영상 분석을 활용하여 ASD를 조기에 진단하고 맞춤형 치료 계획을 제공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이처럼 ASD 치료는 신경과학과 기술을 결합한 혁신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ASD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결론 – ASD는 뇌의 연결성 이상과 신경전달물질의 불균형에서 비롯되는 신경발달 장애이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특정한 뇌 영역의 이상뿐만 아니라, 신경 네트워크의 연결성 차이와 관련이 있으며, 글루타메이트와 가바 시스템의 불균형이 ASD 증상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미래에는 신경과학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맞춤형 치료법이 개발될 것이며, 이는 ASD 환자들의 개별적인 특성에 맞춘 치료 접근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인지과학과 인공지능' 카테고리의 다른 글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0) 2025.03.17 외상 경험과 인지과학 (0) 2025.03.17 ADHD와 인지과학 (0) 2025.03.16 조현병의 인지과학적 특징 (0) 2025.03.16 우울증과 인지과학 (0) 2025.03.16 - 과연결성 가설(Hyperconnectivity Hypothesis)
인지과학과 인공지능
인간의 사고, 학습, 감각, 기억, 창의성, 인공지능과의 접점을 연구하는 인지과학(Cognitive Science)을 중심으로 연구합니다.